2019년 시인 김혜순이 <죽음의 자서전>으로 캐나다 문학상 <The Griffin Poetry Prize>을 받았다. 이 상은 시집에 주어지는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김혜순은 그 해 등단 40주년을 맞은 원로 시인이다.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글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작가다. 자신을 ‘문학적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성적 원전에 부대끼면서도,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서양적 담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사는 ‘제3세계의 여성 시인’이라 고백했던 김혜순 시인. 그가 치열하게 자신의 언어로 써 내려간 시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197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으로 등단한 김혜순에게 한 남성 평론가가 말했다. “식모 이름으로 어떻게 평론가를 해먹어?” 그런 말을 들었던 김혜순은 40년째 시도 쓰고 평론도 쓰면서 살아간다. 시인은 어릴 때 춤추는 걸 아주 좋아했다. 춤을 췄던 경험은 시인이 시 언어로 ‘몸’에 대한 생각을 펼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왜 여성이 쓴 시는 소통의 장에서 소외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쓴 산문집에서 시인은 말한다.
“몸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너와 합일하려는 몸의 욕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궤적이다. 나는 내 몸속에 새겨진 아픔과 병과 기쁨과 욕망을 통하여 남성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느꼈다.”_<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중
2. <당신의 첫> | 문학과지성사 |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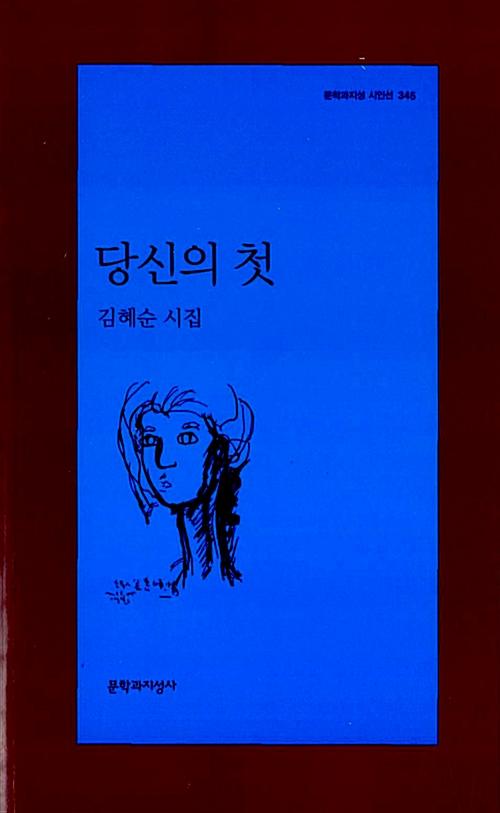
김혜순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이다. 2006년, 김혜순은 ‘모래 여자’라는 작품으로 여성으로서 최초로 미당문학상을 수상한다. 그가 등단한 지 20여 년이 넘은 때였다. <당신의 첫>에는 ‘모래 여자’가 수록되었다. ‘모래 여자’는 모래 속에서 발굴된 여자 미라에 대한 시다. 미라를 꺼낸 사람들은 미라의 “옷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그고 가랑이를 벌리고 머리털을 자르고 가슴을” 연다. 그러고는 다시 꿰매 유리관에 넣는다. 여자가 미라가 된 사연, 미라가 되고 나서의 상황, 그 모습을 내려다본 화자의 이야기가 담겼다. 당시 이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갖은 소외와 수모의 삶을 조용히 견뎌온 한 여성의 삶을 알게 되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시는 ‘여행시’”라고 잘라 말했다 한다.
3.<피어라 돼지> | 문학과지성사 |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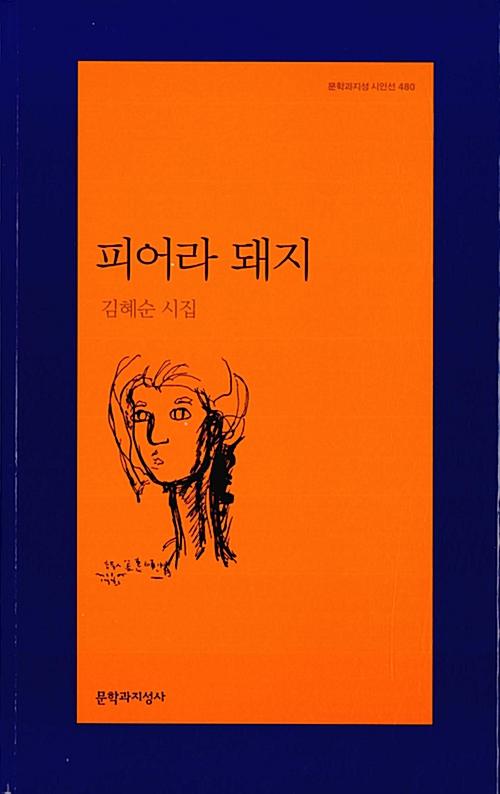
김혜순의 열한 번째 시집이다. 시를 통해 몸, 신체의 고통, 죽음에 천착했던 시인은 그 문제의식을 동물의 고통으로 확장한다. 제목 그대로 시집에는 다양한 ‘돼지’들이 등장한다. 시집 1부 <돼지라서 괜찮아>는 2011년 구제역 때문에 무더기로 생매장당했던 330만 마리 돼지들에 관한, 돼지들을 위한 시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 /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 / 재판도 없이 / 매질도 없이 / 구덩이로 파묻혀 들어가야 한다 (...) 파란 하늘에서 내장들이 흘러내리는 밤! / 머리 잘린 돼지들이 번개치는 밤! / 죽어도 죽어도 돼지가 버려지지 않는 무서운 밤! / 천지에 돼지 울음소리 가득한 밤! / 내가 돼지! 돼지! 울부짖는 밤!”_ <피어라 돼지> 중
시인은 돼지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잔혹한 살육 현장 앞에서 여성성, 육체, 권력, 구원을 주제로 한 시들을 노래한다.
4. <죽음의 자서전> | 문학실험실 |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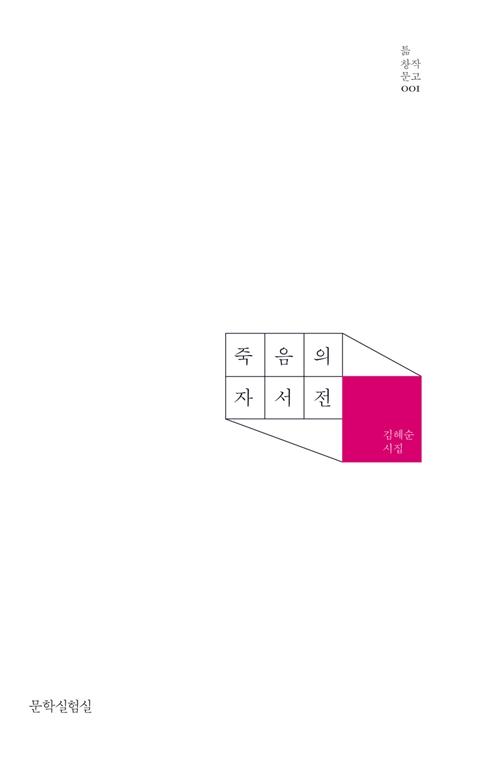
2015년, 시인은 전철 승강장에서 갑자기 쓰러진다. 그때 시인은 문득 떠올라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고독하고 가련한 여자. 시인은 그 경험 직후 죽음에 관한 시를 고통스럽게 적어 나갔다. 억울한 죽음이 도처에 널린 나라에서 아직 죽지 않아 부끄러웠던 시인은 죽음을 선취한 자의 목소리로 시를 쓰고자 했다. 사십구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올리는, 죽은 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죽음의 자서전>에는 총 49편의 시가 실렸다.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얼렀다. / 자장가를 불렀다. / 자장가의 내용은 이랬다. / 자장자장 우리 아가 얼른 죽어 편해지자 더 이상 울지 말자. / 아이의 엄마는 방 한가운데를 파고 아이를 묻었다. / 천장에도 묻었다. 벽에도 묻었다. 눈동자에도 묻었다. / 엄마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이의 이름은 알았다.” _ <자장가-서른이레>
망원동에서 사온 김치만두, 아래서 올려다본 나무, 깔깔대는 웃음, 속으로 삼키는 울음, 야한 농담, 신기방기 일화, 사람 냄새 나는 영화, 땀내 나는 연극, 종이 아깝지 않은 책,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