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제주는 새해면 섬 곳곳에서 마을제를 지내느라 시끌벅적하다. 마을마다 그만의 신당(神堂)이 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저마다의 신을 모신다. 그리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그곳에 있는 열여덟 개의 오름 중 하나인 '당 오름'의 한 귀퉁이에 ‘송당본향당’이 있다. 제주 일만 팔천 모든 신들의 어머니, 백주또(금백주) 여신을 모시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새해, 정확히는 정월 13일에 제주에서 가장 큰 마을제인 신과세제(新過歲祭)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적 제(祭)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드문 행사인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작가나 기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나 정치인이 이곳을 찾아 한 해의 복을 기원한다. 특히 본향당과 주변의 내력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본풀이’는 한국의 원형적 스토리텔링 방식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하고 즐거운 체험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당리는 제주 오름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며, 당오름은 어머니 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새해 즈음하여 제주를 떠올려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제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제주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짧게 소개해보려 한다.
1. “오름 곁에 태어나 오름에서 일하고 오름에 묻힌다”
이것이 제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름이다. 오름의 탄생에 관한 제주의 설화가 재미있다. 천궁 생활이 답답했던 옥황상제의 셋째 딸 설문대할망이 치맛단으로 흙을 날라 만든 섬이 제주도, 그 섬이 밋밋해 보여 일곱 번 흙을 쌓아 올린 것이 한라산, 그러는 중에 새어 나온 흙이 360개의 오름이라고 한다. 혹은 한라산만으로는 밋밋하다 느껴 추가로 360개를 빚었다는 설도 있다. 합리적인 목적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어떤 의미로든 오름은 예술 작품이 분명하다. 이 신비한 오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천착한 작가를 한 명 소개하고 싶다. 바로 48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살다 간 사진작가 김영갑이다.

그는 소탈한 사람이었다. 순수하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데 현란한 수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85년 제주도에 정착하여 2005년 루게릭병으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제주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사람들은 흔히 김영갑을 제주에 미친 작가라고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안 그렇겠냐만 제주 섬은 정확히 마음을 쓴 만큼 자신의 속을 내어준다. 그의 사진에는 제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진심으로 부지런을 떨었을 때만 포착할 수 있는 절경이 있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홈페이지
2. 물숨과 숨비 사이, 해녀
사람들은 제주를 삼다도(三多島)라 불렀다.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아서 붙여진 별명인데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석다(石多), 풍다(風多), 한다(旱多: 가뭄이 많다)로 삼다였으며 여자가 많다는 말은 1960년대 한 여행사에서 지어낸 표현이라고 한다. 어쨌든 (현재는 아니라도) 여자가 현격히 더 많았던 때가 있었다. 정확히는 임금의 수라에 올리기 위한 전복을 캐던 보자기(남자 잠수부)들이 극한의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죽거나 섬 밖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여자가 많다기보다는 남자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해당 포작(鮑作, 보자기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의 의무를 여자들이 지게 되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승의 숨을 깊게 한 번 들이마시고 내려가는 것. 숨을 참고 들어가 제 삶을 건져오는 것. 즉, 숨을 팔아 생을 사는 것. 누군가의 삶을 품평하게 되는 것은 다분히 무례한 짓이지만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묘사될수록 낭만적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감히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탓인지 영화, 사진, 회화, 다큐멘터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녀들의 직관적이고 강렬한 삶의 방식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소설 <폭풍우>에 대해 잠시 얘기하고 싶다. 이는 200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가 지난해 출간한 작품이다. 이 소설엔 베트남 종군 기자 출신으로 예순이 다 된 화자이자 주인공인 ‘필립 키요’, 미군과 서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소녀 ‘준’, 일본군의 사생아였던 해녀 대상군(특히 기량이 출중하며 무리를 지휘할 그릇을 갖춘 해녀) ‘칸도 할머니’ 등 여러 곳으로부터 제주 섬에 도착한 이들이 등장한다. 책을 읽기 전에는 프랑스인 작가에 의해 제주 섬과 해녀라는 소재가 외부인의 시선에서 일방적으로 소비되듯 쓰이진 않았을지 우려했다. 그러나 소설 속에는 매우 생생한 제주가 있다. 한낱 ‘니 것, 내 것’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혹은 초월적인 ‘할망’의 섬 제주가 있다. <폭풍우>에는 바다와 해녀를 매개 삼아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진 슬픔을 품어내는 모습이 덤덤하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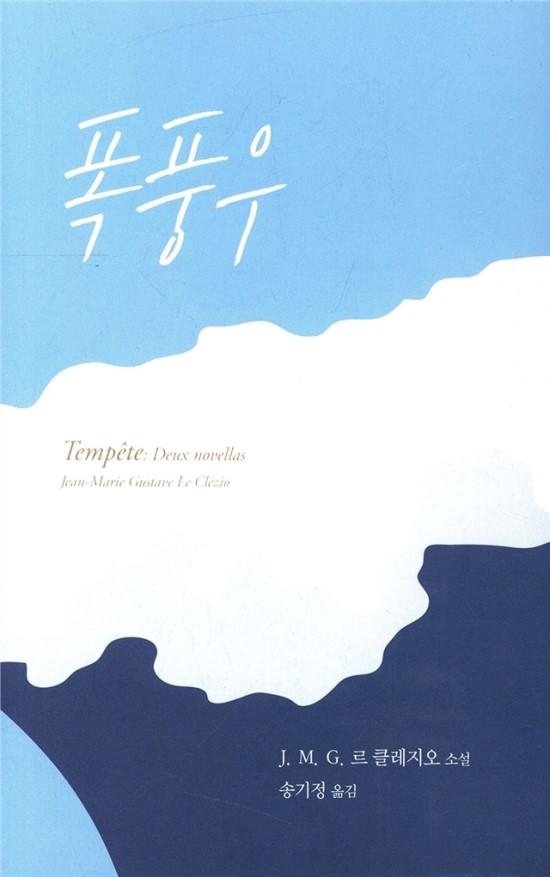
해녀들이 자주 부르던 구전 민요 중에 ‘이어도사나’라는 노래가 있다. 전설의 섬 ‘이어도’를 그리는 노래로, 해녀들은 이 섬에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이 존재하며 먼바다로 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자식, 아버지가 이 섬에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도를 평생 원망하는 곳이자 이상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으로 여기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았다. 삶과 죽음에 관한 희망과 처연함의 정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소설을 읽는 내내 이 노래가 머리를 계속 맴돌았다.
3. 그리고 4·3
제주도 출신 감독 오멸이 만든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다. 감독의 지인인 배우들이 직접 연기해 무척 생생한 제주 사투리가 담겨 있다. 그런 탓에 외국인도 등장하지 않는 영화에 내내 자막이 등장한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도 역시 위에서 말한 제주 민요 ‘이어도사나’가 함께 흐른다. 4·3 사건 당시 섬의 인구가 30만 명이었다. 신고된 사망자 수만 1만 5000명이고 미확인 실종, 희생자를 포함하면 인구 중 10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민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추산하면 14만 명, 이는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다. 영화 <지슬>에는 신위(神位), 신묘(神廟), 음복(飮福), 소지(燒紙), 이렇게 네 개의 소제목이 중간에 차례로 등장한다. 흔히 제사 지낼 때 행하는 순서와 같다. 영화는 사건에 대해 특정 의견을 피력하는 작품이 아니다. 해석하려는 작품 또한 아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섬에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글의 서두에 잠깐 이야기한 어머니오름 ‘당 오름’은 사건 당시 대통령으로서 해당 사건의 계엄령을 선포한 이의 별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는 그런 곳이다.
매번 숙연한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제주로 향하자는 말이 아니다. 도시살이에 지친 우리가 그곳 게스트하우스에서 기타 좀 치고 노래 좀 부른다고,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고 얼큰하게 취해 떠든다고 섭섭할 어머니 제주가 아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 역시 매일을 애달픈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대부분을 웃고 가끔 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멈춰서 울 때 우리 역시 멈춰서 어렴풋이나마 공감할 어떠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주도 가서 한 며칠 쉬다 오고 싶다”고. 그러나 그들에겐 쉴 곳이 없었다. 그래서 설화나 신과 같은 현실 이상의 것을 빚고 그 속에 들어가 쉬었다. 제주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있다. 섬 전체로는 일만 팔천의 신을 모시고 여전히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다. 직계 조상께 지내는 ‘시께’(제사의 제주 사투리)뿐 아니라 조왕제, 성주풀이 등 집에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 십여 명의 신들에게도 제를 올린다.
사실 이 글을 통해 보이는 제주가 아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제주를 얘기해보고 싶었다. 블로그를 뒤적여 제주의 숨겨진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간단하지만 깊게 제주에서 당신이 휴식과 위로를 얻어갈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 글이 그 방법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언어만으로 꽃과 대화하던 시절,
그 시절의 언어를 되찾을 방법으로 미술을 본다.
Flower Vowels라는 영상팀에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다.
Flower Vow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