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과 기쁨의 의미를 한데 담은 단어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 하지만 사회에 통용되는 해당 용어의 어감과 맥은 죄책감보다 부끄러움에 더욱 더 가깝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특정 취향을 감춘다. 왠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기분에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나?' 싶은 거다. 계급사회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믿고 싶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와 부딪힌다. 여전히 그것은 사방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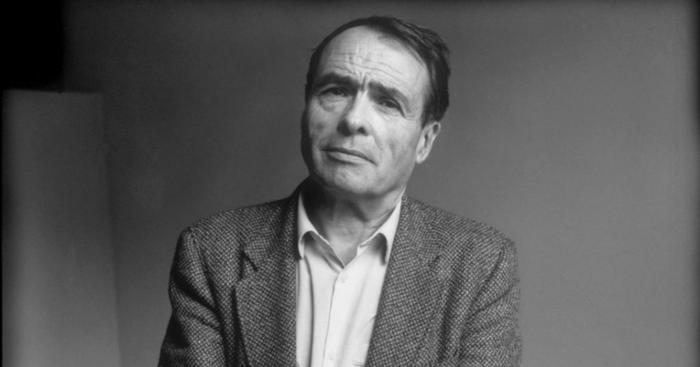
취향은 대표적인 계급의 얼굴이다. 그 때문에 어떤 취향들은 대놓고 애정을 고백하기 힘들어진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각자의 생활 반경에서 굳어진 습관과 사고방식을 계급의 또 다른 얼굴로 보았고, 이를 ‘아비투스’(Habitus)라고 불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극히 한국적인 영화려니 싶었지만 실은 너무나 많은 세계 관객들이 고갤 끄덕여 통감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야말로 아비투스의 향연이다. 고급 취향과 그렇지 못한 취향들. 우리 신분은 매 순간 증명되고 있는 꼴이었고, 관객들은 유산자와 무산자의 맨살이 까발려진 당혹감에 할 말을 잊기도 했다. 하지만 훨씬 흥미로운 대목은 경계 지워진 인물들이 일관성을 잃는 순간들이다. 유치한 속옷 무늬에 페티시를 느끼는 어느 부자의 고백처럼. 마찬가지로 고급 문화 생활이 몸에 밴 교양인에게도 숨 쉴 틈은 있기 마련이다. 지친 하루 끝에 이들이 손을 뻗는 자리는 어쩌면 두툼한 정전보다 눈물과 복수로 얼룩진 통속 드라마일지 모른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감흥이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위로를 주기도 하는 법이니까.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영화의 본질이야말로 쾌락의 감각과 헤어질 수 없다. 고백하건대, 이견 없는 명작들로만 채워진 TOP10 리스트 같은 것에는 그다지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완전무결한 이름들 틈에 삐죽 얼굴을 내민 '이상한' 영화들이 졸린 눈을 뜨게 만든다. 때론 불균질하고 정제되지 못한 텍스트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생경한 시각이 발견되기도 하고, 바로 그런 영화들이 우리들의 지각을 해체하고 새로 쌓아 올릴 힘을 가지고 있다. 마치 외계에서 온 것만 같은 영화들.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은 두려움 속에서 매료되었던 몇 편의 영화를 고백한다.
<데드 얼라이브>(1992)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알려진 피터 잭슨 감독. 그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초기작을 보라. 좀비 영화에 특별한 선호가 없는 평범한 관객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던 나를 재점검하게 만든 영화다. <고무 인간의 최후>, <피블스를 만나요>에 이은 <데드 얼라이브>까지. 매니악한 스플래터 영화를 만들던 그의 모습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다. 안드로메다행 플롯을 좋아하는 비위 튼튼한 관객에게 감히 추천해 본다. 사상 초유의 가짜 피바다에 입이 떡 벌어짐은 물론이며, 펄떡이는 장기 자랑에 폭소를 터뜨리는 조금 낯선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 감독
- 피터 잭슨
- 출연
- 티모시 밸미, 다이아나 페날베
- 개봉
- 1992
<쇼걸>(1995)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폴 버호벤의 영화 중에 과연 '길티'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있느냐고. 아마도 <쇼걸>은 이제 꽤 많은 사랑을 받는 길티 플레저 영화의 대표 주자다. 종종 다른 영화 속에서 <쇼걸>에 열광하는 캐릭터를 괴짜 취급하는 대목이 발견되기도 할 정도. 그도 그럴 것이, 노출 수위가 적당한 장면이 당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데다가 전형적인 할리우드 클리셰로 치자면 셀 수도 없다. 골든 라즈베리 영화상을 석권하며 최악의 영화로 이름 날리던 <쇼걸>. 하지만 점차 팬심을 고백하는 영화광이 늘어갔고 짐 자무쉬와 쿠엔틴 타란티노는 <쇼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까지 했다.

- 감독
- 폴 버호벤
- 출연
- 엘리자베스 버클리, 카일 맥라클란, 지나 거손, 글렌 플러머, 로버트 다비, 알랜 라킨즈, 지나 라베라
- 개봉
- 1995
<캔디맨>(1992)

거울을 향해 ‘캔디맨’의 이름을 다섯 번 부르면 갈고리 손의 캔디맨이 나타나 당신을 해칠 것이다! 싸구려 도시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꽤 그럴듯한 전개로 확장하는 재주도 이정도면 경탄할 만하다. 현실과 오컬트, 오컬트와 정신분석적 접근이 뒤엉킨 기묘한 에너지가 <캔디맨>에 드리워져 있다. 불필요한 여주인공의 노출신이 이따금씩 불편한 감흥을 주기도 했지만, 끝내 이 영화를 미워하지는 못하겠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도시의 풍경으로 불어넣은 긴장이,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흐름 사이에서 차츰 커진다.

- 감독
- 버나드 로즈
- 출연
- 버지니아 매드슨, 토니 토드, 잰더 버클리, 카시 레몬즈
- 개봉
- 1992
<런던의 늑대인간>(1981)

딱 봐도 결코 만점짜리 영화는 못될 것 같은 해괴한 제목에 이끌린 대로, <런던의 늑대인간>은 참 해괴한 영화였다. 배낭여행을 떠난 청년이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어기면서 늑대 인간이 되고 자업자득의 소동이 벌어진다. 흔하디흔한 스토리다. 하지만 희생양의 유령들과 조우하는 등 일련의 발상들이 퍽 기발하고 1981년이라는 제작연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아주 인상적인 그래픽 장면들이 시선을 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이 영화에 매료되어 '스릴러(Thriller)'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존 랜디스에게 의뢰했다.

- 감독
- 존 랜디스
- 출연
- 데이빗 노튼, 제니 에구터, 그리핀 던, 존 우드바인
- 개봉
-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