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인 파울 첼란은 “시는 유리병에 담긴 편지와 같다”고 했다. 언젠가 그 어딘가에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도, 영영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 편지. 시의 행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유리병에 담긴 편지를 받는 일과 같지 않을까. 편지 속 시어는 대게 추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감정의 파노라마가 모두 담겨있다.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편지를 해독하기 위해 시가 탄생한 순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혹은 편지의 작성자가 되거나. 일상에서 피어오르는 시, 시의 궤적을 포착한 詩의 영화를 지금 바로 만나보자.
<일 포스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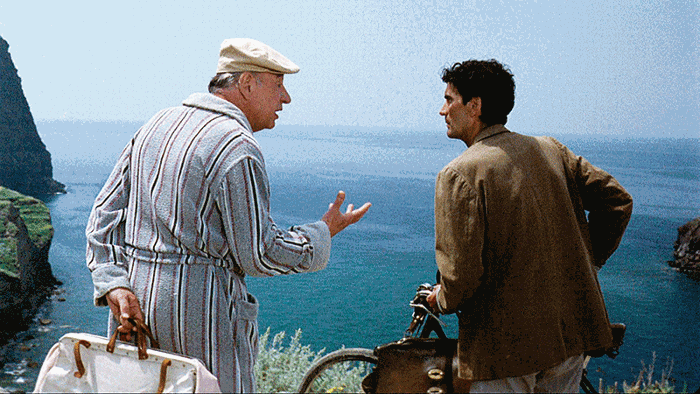
시를 다룬 영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유명한 명성만큼이나 시의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영화 <일 포스티노>를 소개한다. 마이클 레드포드가 연출한 <일 포스티노>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실화인 동시에 작가 안토니오 스타르메타의 책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탈리아의 감성을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영화는 1994년 작으로 영화는 몰라도 OST는 익숙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인용돼 왔다. 영화를 아우르는 배경 음악만큼이나 잔잔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전개는 시인 ‘네루다’(필립 느와레)와 우편배달부 ‘마리오’(마리모 트로이시)의 곁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이 영화는 수줍음이 많은 청년 마리오가 네루다를 만나면서 쓰게 되는 ‘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은유, 메타포에 대해 이보다 낭만적으로 설명한 작품이 또 있을까.

마리오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단순히 네루다처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시가 어떻게 쓰이는지, 메타포란 무엇인지, 시에 대해 문외한이던 마리오는 네루다를 통해 시의 화법을 터득해간다. 시의 의미를 묻는 마리오의 질문에, 네루다는 “마리오, 내가 쓴 시 구절은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네. 시는 설하면 진부해지고 말아.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뿐이야”라고 말한다. 시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저 느낄 것. 영화 초반부의 마리오는 경직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아름다운 메타포가 쏟아진다. 특히 마리오가 말하는 ‘섬의 아름다움’은 영화의 하이라이트.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이 섬의 아름다움을 말해 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이름 ‘베아트리체 루소’라 말한다. 네루다가 칠레로 떠난 1년 뒤, 마리오는 네루다를 위해 녹음테이프에 섬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절벽의 바람 소리, 교회의 종소리, 태아의 심장 소리.

- 감독
- 마이클 래드포드
- 출연
- 필립 느와레, 마시모 트로이시
- 개봉
- 1994
<패터슨>

<천국보다 낯선>,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등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보유한 감독 짐 자무쉬의 영화 <패터슨>은 이름처럼 주인공인 버스 기사 ‘패터슨’(아담 드라이버)의 일상을 조명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지나치게 차분해 보인다. 자극적인 소재, 드라마틱한 전개, 화려한 영상미에 익숙한 우리에게 패터슨은 밋밋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같다. 흔한 고난과 역경이 없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포인트도 없으며, 굵직한 메시지를 건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맞추며 굳건히 살아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 속에 시어가 피어난다. 패터슨을 통해 볼 수 있듯 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순간은 없다. 지나치게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낭만을 찾게 만드는 게 시가 아닐까. <일 포스티노>가 시에 대한 정의에 가깝다면, <패터슨>은 시가 쓰이는 과정에 관해 서술한다.

패터슨의 일상은 일정한 패턴을 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로라’(골쉬프테 파라하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버스를 운전대를 잡다 쉬는 시간에 시를 쓰고 다시 운전하며 퇴근 후에는 반려견 마빈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간다. 차분하고 잔잔한 캐릭터인 패터슨과 반대인 역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캐릭터인 로라, 정반대 성향인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게 되지만 이들은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고 응원한다. 패터슨은 일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날로그에 가까운 삶은 향유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당하지 않는 패터슨, 자신의 일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시인 패터슨의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영화.

- 감독
- 짐 자무쉬
- 출연
- 아담 드라이버, 골쉬프테 파라하니
- 개봉
- 2016
<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시는 삶을 외면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줄 영화 <시>. 이창동 감독의 <시>는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을 정도로 섬세한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는 현실적이면서도 은유적이고 철학적이며 앞서 소개한 두 작품과 달리 이창동 감독 작품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영화 속의 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흐름을 더 면밀히 살펴보게 만들지만 어지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 '양미자'(윤정희)의 이야기를 농축 시켜 낭송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실제 김용택 시인이 연기한 ‘김용탁’ 시인이 진행하는 강좌에서 양미자는 시에 대해 배우고,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순간 시의 아름다움에 빠진다. 매일 보던 사과가 달라 보이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나무를 한참 바라보게 되고, 후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처절하게 고뇌한다.

양미자는 간병인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자 '종욱'(이다윗)과 함께 사는 인물이다. 꽃무늬 옷을 즐겨 입는 화사한 분위기처럼 명랑한 소녀같은 감수성을 지녔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다. 문화센터의 시 강좌를 등록하게 되고 시상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는 시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하지만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포착하게 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종욱이 집단 성폭행 자살 사건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부모, 죽은 '희진'의 흔적, 알츠하이머 판정. 자살한 희진의 세례명은 ‘아네스’. 성당에서 희진의 사진을 훔쳐 달아난 그 날밤, 양미자는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를 써 내려간다.

- 감독
- 이창동
- 출연
- 윤정희
- 개봉
- 2010